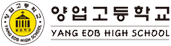2004년 성탄절에
작성자 : 후원회 | 조회수 : 2,888 | 작성일 : 2005년 1월 3일
성탄 전야에 주임교수로부터 “오 선생이 세례받기를 청합니다.”라는 간결한 문자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오 교수(43세)는 세브란스 병원 암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한지도 2년3개월이 되었다.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대학원의 2학기가 시작되고 세 번째 맞이하는 수업시간, 교수님은 선선한 날씨인데도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 열이 오르고 감기증세려니 했는데 병원에서 폐암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한 쪽 폐를 떼어낸 후에도 수업시간에 출강을 했지만 전이가 심해 수업이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줄곧 투병생활이었다. 가끔 주임교수와 병문안 할 때마다 오 교수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을 했지만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았음을 느낄 뿐이었다. 긴 투병생활이지만 워낙 건장한 체격에 넉넉한 성품은 쾌유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지만 식음을 거둔지가 60여일이 지나 어두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2004년 성탄절 전야미사에 복음 강론을 위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성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 어둔 밤을 지나는 사람들,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기쁜 소식’으로 다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런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성탄 날 오후 주임교수, 위 교수, 박 선생과 함께 병실 문을 열었다. 세례 준비를 한 후 “원합니까? 네, 끊어버립니까? 네, 믿습니까? 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파엘에게 세례를 줍니다.” 성체를 모셔 주려 했으나 넘길 수가 없었다. 메주고리에서 선물로 받은 묵주를 손에 쥐어주었다. “주님과 함께 잘 떠나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오 교수로부터 “네”라는 또렷한 응답을 들었고, 한해가 저무는 2004년의 29일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두 아이의 훌륭한 아버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학교에서 성실한 교수, 이제 그 분의 모습은 마음에서나 꺼내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미래를 향해 열심히 공부했던 노력들, 책장의 손때 묻은 전문 서적들, 함께 했던 아름다운 기억들, 이 모두는 살아 숨 쉬는 우리들 안에 남겨주고 저 세상으로 떠나간 것이다.
수업시간에 넉넉한 미소, 때론 질책으로 한국교육사, 동양철학을 강의하며 충실하게 제자를 가르쳐주던 마음, 덩치답게 믿음직하고, 귀족적 마음을 보였던 시간들, 언젠가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 들러 시원하게 들려주던 열창, 그런 모습들이 스쳐지나가며 우리들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10살 난 상주가 빈소를 지키며 마지막 황제처럼 철없이 서성인다. 둘째를 낳던 날 수업시간에 그렇게 신바람 나 좋아했던 모습, 그 기쁨보다는 오래도록 점점 깊어져가는 자신의 어두움을 헤아리던 시간들이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영안실에서 옹기종기 서성이다가 흐느껴 울고 있는 것이다.
떠나면서 마지막 시간에 받은 세례성사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고백에서 얻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다. 하느님의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다. 이별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위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어둡고 비천한 인간에게 한없는 위로와 위안을 주며 기쁨이 되어 온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다. 이렇게 떠날 수 있도록 큰 사랑으로 배려해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떠나는 교수에게 진한 사랑을 쏟아준 주임교수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한줌의 재로 돌아 갈 인간이지만 “참 빛은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고 있다.”(요한 1.5) 여기 영안실에 죽음이 있지만 성탄은 온기를 느끼게 한다. 죽음 안에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죽음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깨달을 때, 한 인간의 존재의미는 더욱 훌륭한 완성에로 향해 간다.
2004년 성탄절 전야미사에 복음 강론을 위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성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 어둔 밤을 지나는 사람들,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기쁜 소식’으로 다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런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성탄 날 오후 주임교수, 위 교수, 박 선생과 함께 병실 문을 열었다. 세례 준비를 한 후 “원합니까? 네, 끊어버립니까? 네, 믿습니까? 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파엘에게 세례를 줍니다.” 성체를 모셔 주려 했으나 넘길 수가 없었다. 메주고리에서 선물로 받은 묵주를 손에 쥐어주었다. “주님과 함께 잘 떠나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오 교수로부터 “네”라는 또렷한 응답을 들었고, 한해가 저무는 2004년의 29일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두 아이의 훌륭한 아버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학교에서 성실한 교수, 이제 그 분의 모습은 마음에서나 꺼내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미래를 향해 열심히 공부했던 노력들, 책장의 손때 묻은 전문 서적들, 함께 했던 아름다운 기억들, 이 모두는 살아 숨 쉬는 우리들 안에 남겨주고 저 세상으로 떠나간 것이다.
수업시간에 넉넉한 미소, 때론 질책으로 한국교육사, 동양철학을 강의하며 충실하게 제자를 가르쳐주던 마음, 덩치답게 믿음직하고, 귀족적 마음을 보였던 시간들, 언젠가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 들러 시원하게 들려주던 열창, 그런 모습들이 스쳐지나가며 우리들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10살 난 상주가 빈소를 지키며 마지막 황제처럼 철없이 서성인다. 둘째를 낳던 날 수업시간에 그렇게 신바람 나 좋아했던 모습, 그 기쁨보다는 오래도록 점점 깊어져가는 자신의 어두움을 헤아리던 시간들이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영안실에서 옹기종기 서성이다가 흐느껴 울고 있는 것이다.
떠나면서 마지막 시간에 받은 세례성사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고백에서 얻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다. 하느님의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다. 이별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위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어둡고 비천한 인간에게 한없는 위로와 위안을 주며 기쁨이 되어 온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다. 이렇게 떠날 수 있도록 큰 사랑으로 배려해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떠나는 교수에게 진한 사랑을 쏟아준 주임교수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한줌의 재로 돌아 갈 인간이지만 “참 빛은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고 있다.”(요한 1.5) 여기 영안실에 죽음이 있지만 성탄은 온기를 느끼게 한다. 죽음 안에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죽음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깨달을 때, 한 인간의 존재의미는 더욱 훌륭한 완성에로 향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