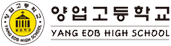체감온도
작성자 : 후원회 | 조회수 : 3,104 | 작성일 : 2005년 2월 19일
어린 시절, 주일이면 늘 30여리 길을 걸어 주일미사에 참례했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소로 길, 논둑길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사시사철 달리며 보던 나무들은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어 지금까지 내 마음에 남아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겨울 성탄 밤 미사를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 길은 혹한 자체였는데 북쪽으로 방향을 두고 걸을 때면 살 속까지 파고드는 바람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 얇은 면내의에 광목기지의 교복, 털 스웨터도 제대로 입기 힘든 그 때에 구멍 난 목양말과 얇은 운동화로 추위를 버티며 발을 구르기도 하였다. 지금 교사부부는 대재벌이라고 하던데 우린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늘 부유하다는 느낌이 없었다. 수입의 모두를 육남매 자녀 교육에 써버렸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지금의 추위는 옛날의 추위와 비교도 안 되는 것을 느낀다. 지구의 온난화로 겨울답지 않은 멍청한 겨울이 된 것 같아 소리 한번 질러 보았다. “나는 겨울다운 겨울을 원한다.” 하느님께서 나 같은 원망을 들으셨나 보다. 요즘 겨울 추위가 제법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추위와 무관하다. 어디를 가든 차로 내달리고, 사무실은 온기로 가득하고, 집에 들어오면 러닝 바람에 지내니 말이다. 일정한 수입과 여유로운 마음,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 이 모두가 제자리를 잡고 있기에 아무리 칼바람 불어 시리더라도 체감온도 따위는 감이 잡히질 않았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사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는 한 친구는 IMF 한파로 40대 초반에 조기 퇴직을 했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에 그 많던 퇴직금이 남아있을 리 없다. 인생 5학년을 바라보니 가진 것 하나 없어 세상이 황량하기만 하다. 아무도 여기 직장이 있으니 오라는 손짓이 없었다. 가정 경제로 겪는 체감온도로 더욱 겨울은 추워만 갔다. 결국 목구멍 때문에 차린 것이 포장마차 같은 음식점이었고 처음에 개업 발을 조금 받았지만 얼마 안 가서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런 다음 떼돈을 벌 것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고 목도 좋지 않은 구석진 곳에다 통닭집을 차렸다. 개업을 하자마자 재수 없게 조류독감으로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 마리도 팔리지 않는 날들이 연속되었다. 이것, 저것 하며 지내는 동안 퇴직금은 다 떨어 먹어 하는 수 없이 가족을 남겨두고 서울 한 복판의 건설현장에 섰다. 고작 한 달 월급, 일백만원이 조금 넘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여파는 체감온도가 되어 가족 친지들에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추운겨울이 왔고 난방시설은 멈춰 섰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 추위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옆에서 느낄 정도였다. 나는 너무 가련하여 그 가장의 마음이 되어 직장을 찾아나서 보았다. 하느님께서는 40대의 절박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직장을 마련해 주셨다. 직장을 얻은 친구는 나에게 “집에 여전히 불을 넣지 않았는데 이젠 집이 따듯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에 나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예나 지금이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견딜만한 추위도 더욱 큰 체감온도가 되어 다가온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않았다. “겨울이 왜 이렇게 멍청하냐!” 라고 무심코 던진 한 마디가 수많은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후벼 파놓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죄스러웠다. 체감온도가 컸던 친구에게 직장을 마련해줄 내 안에서는 마치 새벽동이 움터 나오듯 기쁨으로 가득 찼다. 설 명절인데도 경제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들이 있다. 어려운 이웃들이 사순절을 정성 것 지내는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고통을 딛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기쁨과 봉헌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한다.
내가 아는 한 친구는 IMF 한파로 40대 초반에 조기 퇴직을 했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에 그 많던 퇴직금이 남아있을 리 없다. 인생 5학년을 바라보니 가진 것 하나 없어 세상이 황량하기만 하다. 아무도 여기 직장이 있으니 오라는 손짓이 없었다. 가정 경제로 겪는 체감온도로 더욱 겨울은 추워만 갔다. 결국 목구멍 때문에 차린 것이 포장마차 같은 음식점이었고 처음에 개업 발을 조금 받았지만 얼마 안 가서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런 다음 떼돈을 벌 것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고 목도 좋지 않은 구석진 곳에다 통닭집을 차렸다. 개업을 하자마자 재수 없게 조류독감으로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 마리도 팔리지 않는 날들이 연속되었다. 이것, 저것 하며 지내는 동안 퇴직금은 다 떨어 먹어 하는 수 없이 가족을 남겨두고 서울 한 복판의 건설현장에 섰다. 고작 한 달 월급, 일백만원이 조금 넘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여파는 체감온도가 되어 가족 친지들에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추운겨울이 왔고 난방시설은 멈춰 섰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 추위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옆에서 느낄 정도였다. 나는 너무 가련하여 그 가장의 마음이 되어 직장을 찾아나서 보았다. 하느님께서는 40대의 절박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직장을 마련해 주셨다. 직장을 얻은 친구는 나에게 “집에 여전히 불을 넣지 않았는데 이젠 집이 따듯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에 나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예나 지금이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견딜만한 추위도 더욱 큰 체감온도가 되어 다가온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않았다. “겨울이 왜 이렇게 멍청하냐!” 라고 무심코 던진 한 마디가 수많은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후벼 파놓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죄스러웠다. 체감온도가 컸던 친구에게 직장을 마련해줄 내 안에서는 마치 새벽동이 움터 나오듯 기쁨으로 가득 찼다. 설 명절인데도 경제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들이 있다. 어려운 이웃들이 사순절을 정성 것 지내는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고통을 딛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기쁨과 봉헌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