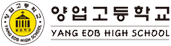꿈 없는 아이들의 정기 모임~
작성자 : 김경숙 | 조회수 : 6,061 | 작성일 : 2010년 4월 14일
[ESSAY] 꿈 없는 아이들의 정기 모임
▲ 인문계 여고 2학년 여학생의 글
10시 19분. 10시 19분 24초. 10시 19분 43초. 10시 19분 56, 57, 58, 59초.
(1분간 제가 시계를 확인한 횟수입니다.)
드디어 2교시가 끝났습니다. 종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팔을 베개 삼아 잽싸게 얼굴을 묻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다가 다음 과목이 수학이라는 사실에 다시 얼굴을 묻습니다.
지금 자두지 않으면 3교시엔 머리가 폭발해버리고 말 거야라고 제 머리가 지시합니다. 방금 끝난 윤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봤습니다. 인간의 감각적 경험과 유용성을 중시한 소피스트, 주지주의와 지행합일설을 주장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이미 머릿속 메모리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3교시 시작 종소리. 제 작은 머리가 말합니다.
난 아직 다른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울부짖는 머릿속과는 상관없이 어느새 수학 선생님은 기호와 숫자로 칠판을 채워가고 계셨습니다. 잠깐 식을 놓치니 다시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수학은 내게 알 수 없는 외계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언뜻 봐도 삼분의 일은 딴 짓을 하고 있고 삼분의 일은 잠에서 헤어 나오질 못합니다. 저 아이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걸까. 다르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4교시는 체육입니다. 주요 과목이 아니라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시간이죠. 운동신경이 없어서 수행평가는 항상 C도 아닌 D를 맞지만 그래도 나름 운동장에서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활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끼리끼리 앉아 이야기를 하다 보면 50분이란 시간은 10분 정도로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5교시 예비 종소리가 울리면 나의 머리는 또다시 긴장 상태. 머릿속에서 혼자만의 대화가 다시 이어집니다.
‘오늘 과학 시간엔 잠을 잘 거지?
아니 오늘은 수업을 열심히 들을 거야.
항상 넌 그렇게 말하지. 문과생인 네가 과연 과학 시간에 집중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그만 잠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비몽사몽 상태의 저를 일깨우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어느샌가 과학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었다. 꿈이 없었단 거지. 지금은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원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교생 실습도 하고, 지금 이렇게 일을 잘해내는 것을 보니 나한테 교사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엔 하고 싶은 일이 없다 해도 가능성의 문을 넓혀 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 길을 가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다."
그 말은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는 제가 원하는 말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아니 이 나라에서 확실한 자기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져온 확고한 꿈.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영화·드라마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란에는 작가라는 두 글자를 고민 없이 씁니다. 세계 최고의라는 수식어도 붙이고 싶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얼굴이 그다지 예쁘지 않은 아이가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를 꿈꾸는 것과 같은 얘기로 들릴 테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부평 지하상가 옷장사인 학교 선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배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 어떻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룬 것이죠. 크건 작건, 꿈을 이룬다는 것, 아니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꿈 없는 아이들의 정기 모임 장소와 같습니다. 8살이 되던 해에 학교라는 곳에 초대장을 받고 19살까지 정기적으로 월요일부터 둘째·넷째를 뺀 토요일까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곳. 모여서 하는 일은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머릿속 메모리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19살이 되는 해 11월에 보는 한 번의 시험으로 그 정기 모임은 비로소 끝이 납니다. 결과에 따라 1등급은 좋은 곳으로, 불량품인 9등급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진짜 꿈을 찾아주고, 그걸 이룰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학교가 그립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 매일, 적어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 머리에 집어넣었던 그 지식들이 제 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학교 말입니다. 큰 세상을 보고 싶은 우리와 교과서 안의 정보를 전해주는 학교가 서로 통할 수 있는 법을 누군가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순 암기로 단순해진 저의 뇌는 어떤 창의적인 것을 요구받을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아이들의 정기 모임 장소가 아닌 꿈의 공장에 다니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