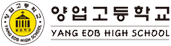단풍과 낙엽 사이에서
작성자 : 장홍훈 | 조회수 : 389 | 작성일 : 2023년 11월 3일
단풍과 낙엽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느린 것, 사소한 모든 것을 집어삼키거나, 위대한 것에는 생명과 영혼을 불어넣는 것, 그것을 시간이라 하지 않던가. 삶의 가장 심오한 시간은 낮과 밤의 빛의 리듬이요, 조수간만의 리듬이요, 봄·여름·가을·겨울로 바뀌는 아름다운 사계의 리듬이다.
미련도 후회도 미움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붉고 붉게 타오르는 단풍이 낙엽이 되어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가을이다. 봄 여름 내내 나무 둥치를 위해 할 바를 다했다는 듯한 잎새들이 낙엽이 되어 대지로 가라앉는 때이다. 지금은 낙엽이지만 새잎일 때가 있었다. 최선을 다해 태양 빛을 받아서 나무의 뿌리를 튼튼히 하며 나무를 키우고, 가지를 늘리고 꽃을 피운 때도 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고 여한 없이 활활 단풍으로 타다가 뿌리 쪽으로 돌아가는 낙엽의 모습을 거울삼아 삶을 관조한 반숙자 선생님의 「낙엽주 특강」의 한 구절을 되새긴다.
“낙엽이 질 때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어느 가을 우연히 바라본 광화문 글판의 글이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여한 없이 불타본 적이 있는가, 불타기는커녕 생채로 시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버려야 할 것들을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면서 연탄 한 장의 온기나마 누군가와 나누었는지, 노란빛으로 물든 은행나무를 보며 마음 갈피를 뒤적여 본다.”
진짜 가을 낙엽은 아무 걱정이 없는지, 가을 끝에 닥쳐올 겨울의 사멸이 두렵지 않은지. 그 낙하 몸짓은 조금도 무거워 보이지 않고 아주 가뿐하다.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도래를 분명히 알기에, 낙엽은 곤두박질치면서도 무거워 보이지 않는 것이리라. 미구에 틔울 생명의 새 시작을 믿기에, 희망하기에 낙엽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리라.
가톨릭 교회는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하고 죽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은 내게, 내일은 네게 Hodie mihi, Cras tibi ”라는 무덤 앞의 라틴어 격언을 마주하며 죽음을 묵상한다.
마지막 생명의 마감은 암흑이고 고독이며 허무이고 결별이다.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 버리고 사람의 육신으로부터 영혼을 분리시킨다. 죽음은 축제의 폐막이나 만남의 마지막 인사처럼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죽음은 상실, 단절, 분리, 파괴이다.
그러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완성, 마무리, 성취이기도 하다. 결정적인 것, 궁극적인 것은 막판에 출현한다. 완성도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다. 생명의 마감이 성취를 뜻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슬픔과 고통도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면학의 각고 끝에 얻은 내면의 성장, 산고 후에 얻은 생명, 이데아의 도달은 마감의 결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죽음이 없다면 생명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까?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죽음이 없다면 삶은 마무리되지도 결실을 거두지도 못한다. 결실은 나중에 최종 순간에 거두어지는 수확이다. 끝없이 연속되는 삶은 별로 값어치 없고 싫증과 권태의 연속일 뿐이다. 죽음이라는 마지막이 있기에 생명이 소중한 것이다. 병자가 건강의 소중함을 실감하듯이,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명의 귀중함과 고마움을 알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성실히 엮어 나가는 이치이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진정한 아름다움의 빛을 발하는 단풍이 될 수 있고, 가장 가뿐하게 대지에 입 맞추는 낙엽이 될 수 있다. 가장 고운 빛깔로, 가장 아름다운 몸짓으로, 가장 성스러운 언어로,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