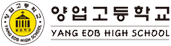빵긋빵긋 웃는 빵이 좋다.
작성자 : 장홍훈 | 조회수 : 2,306 | 작성일 : 2020년 6월 5일
빵긋빵긋 웃는 빵이 좋다.
뻐-국, 뻐국새 우는 뜨거운 태양 아래 딸기, 토마토, 당근, 깻잎, 상추만이 살쪄가는 시절이 아니다. 그 옆에 하루가 무섭게 번지는 잡초도 있다. 아직 시원한 조석을 놔두고 한낮에 텃밭에 나와서는 이 무슨 땀범벅인가? 그러나 이런 자책을 무마해버리고도 남는 이치도 있기에 도리어 기분 좋아지는 풀 뽑기이다. ‘빵’을 얻기 위해선 땀을 흘려야 한다는 쉬운 이치이다.
빈손으로 세상에 와서는 재물 · 권력 · 출세 · 학문 등 온갖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라지만, 그래도 엄연한 사실 하나는 있다. 오늘의 양식이 절대 필요하다는 현실이다. 그 누구에게나 빵이 필요하다.
‘빵’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데, ‘부서지다, 사라지다’라는 무시무시한 뜻을 지니고 있다. 빵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게 역설적으로 ‘또 다른 주검이 주는 열매’이라서 이다. 빵을 먹으면서 히브리인들은 고통의 냄새, 죽음의 맛도 새긴다고 한다. 한 알의 밀알이 부서져 싹을 틔우고, 열매가 되자마자 또 산산이 으깨어져야, 뜨겁게 구워져야, 빵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눈물과 땀과 피가 섞인 빵 맛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맛과도 같아진다는 뜻이다.
까뮈의 대표작 「페스트」의 한 장면이다. 어둠과 악을 상징하는 페스트가 한 마을을 엄습한다. 무신론자인 의사와 예수회 신부 앞에서 한 젖먹이가 몸을 뒤틀며 죽어간다. 의사는 “이 젖먹이는 죄가 없다. 당신도 그걸 모를 리 없지.”라고 내뱉고는 방을 나간다. 이는 흡사 ‘만약 하느님이 있으시다면, 그 하느님이란 얼마나 무자비한가’라고 쏘아붙이는 투다. 신부는 그래도 강론을 이어 간다. “지금 아이의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 쓰디쓴 빵이다. 하지만 이 쓴 빵이 없이 우리 영혼은 굶주려서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일찍이 괴테도 비슷했다. “하늘의 힘을 모르고 말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여...”
점심때 빵이 나왔다. 함께 식탁에 앉은 학생의 이름이 ‘다영’이다. 그 옆에서 다영이의 절친이 이름을 가지고 놀린다. “얘는 보나 마나 다 빵점이예요. 다영이잖아요” 나는 아직 텃밭에 한창 자라나는 시절 같은 그들을 보고 물었다. “그래, 빵 맛이 어떠냐?” “예,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대화 중 이런 생각이 스친다. ‘얘들이 빵 맛을 아는 걸까? 밀알 하나가 땅에 죽어, 물과 햇빛을 제대로 받아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바수어져 가루가 되고, 그 반죽이 뜨거운 불을 견뎌야, 마침내 달콤하고 고소하며 부드러운 ‘생명의 빵’이 된다는 것을….”
양업고에는 특성화 과목으로 ‘노작(勞作)’의 시간이 있다. 700평 되는 밭에 나가 농사를 짓는다. 올해는 등교가 늦어져 선생님들이 미리 학생들이 원하는 작물들을 신청받아 심어놓았다. 인터넷 수업을 하다가 등교한 고 3학년들이 첫 노작을 마치고는 이구동성이다. “너무 땀이 나요, 그런데 재밌어요. 신기하게 고추와 오이가 열렸어요.”
무엇이 아이들에게 빵의 맛을 알 수 있는 교육일까? 태양 아래 땀을 흘려 보는 것, 그 결과로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야말로 ‘빵 교육’이자 ‘생명 교육’일 터다. 참으로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한 ‘빵’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람이 또한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태 4,4) 그래서 얼토당토않은 아재 개그가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어찌 막으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이라는, 이 사회라는 밭에서 늘 “빵긋빵긋 웃는 ‘빵’의, 웃음 전도사”가 되었으면 좋겠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