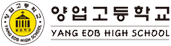꿈을 살다. 2학년 강민지의 글
작성자 : 윤병훈 | 조회수 : 3,945 | 작성일 : 2011년 9월 16일
꿈을 살다: 꿈을 잃었을 때와 찾았을 때
“너 왜 그렇게 사니?”
이 말은 제가 2009년 인문계고 1학년을 다닐 때 친구에게서, 선생님에게서, 또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말입니다. 이 말에 저는 처음 그저 멍하니 있었고 두 번째에는 분노의 눈빛을 보냈고 세 번째에는 두 눈 가득히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두 눈을 감고서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바랬습니다. 자꾸만 엄습해 왔던 무력감이라는 녀석이 저의 사지를 붙들고 있었고 저는 늘상 허공을 바라보며 어깨를 늘어뜨린 채로 이대로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기를 하는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저의 눈동자가 두려움과 창피함에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길을 걷다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면 여지없이 그 길을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이미 제 안의 저는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말을 걸라치면 뒷걸음질쳤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못난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말입니다. 하루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은 저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간혹 누군가가 저에게 꿈을 물었습니다.
하루 사는 것도 고통인 저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언제쯤 죽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에게 그런 질문은 딴 세상 말이었습니다.
처음 왜 그렇게 사냐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음 날 그 말을 잊었습니다. 마치 빗물이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듯이 그 말은 그저 잠시 떨어진 한 방물의 빗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을 했던 분을 원망했습니다. 고장나버린 고물에대고 칼로 이리저리 들쑤시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폐기물이 될텐데 놀리듯이 상처만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학교를 자퇴하고서 대안학교에 새로이 복학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때였습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1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쓰레기통에 버려져 쩔쩔매던 꿈이라는 것을 꺼내고자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그 말에 저는 설움의 눈물이 차오름을 느꼈습니다. 허름해진 꿈일지라도 다시 끌어안고자 두 손 가득 들고 있었는데 그 희망의 서곡에서 그만 노래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나를 혼내도 친구에게서 모진 말을 들어도 시험에서 꼴등을 해도 목석처럼 가만히 있던 아이였습니다. 슬프긴 했지만, 늘상 반복되는 일들이라 체념했었고 아무렇지 않게 흡수시켜버리곤 감정도 이성도 백지 뒤로 덮어버린 채 지냈습니다.
그러던 제가 속상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다시 ‘꿈’을 꾸고자 생각하니 전에는 없었던 빛이 느껴졌었고, 변화하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듣자 더 잘하고 싶어 눈물이 흐른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울며 좌절했던 것이 아니었고 아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는(꿈을 추구하고 싶다는) 간절함에 눈물로 저의 감정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눈물은 흘렀지만 속으론 행복했습니다.
꿈을 찾음으로써 저는 메말랐던 감정이 살아남을 느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불행한 이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가 아니라 꿈을 꾸지 않는 자라는 것을 온 몸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끝없이 도전하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사는 삶이 분명 우리 모두를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학년 강미지 학생의 글로 ‘INDIGO+ing' 31권,p20-21,에서 투고한 글을 발췌 옮겨놓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이 말은 제가 2009년 인문계고 1학년을 다닐 때 친구에게서, 선생님에게서, 또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말입니다. 이 말에 저는 처음 그저 멍하니 있었고 두 번째에는 분노의 눈빛을 보냈고 세 번째에는 두 눈 가득히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두 눈을 감고서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바랬습니다. 자꾸만 엄습해 왔던 무력감이라는 녀석이 저의 사지를 붙들고 있었고 저는 늘상 허공을 바라보며 어깨를 늘어뜨린 채로 이대로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기를 하는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저의 눈동자가 두려움과 창피함에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길을 걷다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면 여지없이 그 길을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이미 제 안의 저는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말을 걸라치면 뒷걸음질쳤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못난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말입니다. 하루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은 저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간혹 누군가가 저에게 꿈을 물었습니다.
하루 사는 것도 고통인 저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언제쯤 죽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에게 그런 질문은 딴 세상 말이었습니다.
처음 왜 그렇게 사냐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음 날 그 말을 잊었습니다. 마치 빗물이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듯이 그 말은 그저 잠시 떨어진 한 방물의 빗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을 했던 분을 원망했습니다. 고장나버린 고물에대고 칼로 이리저리 들쑤시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폐기물이 될텐데 놀리듯이 상처만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학교를 자퇴하고서 대안학교에 새로이 복학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때였습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1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쓰레기통에 버려져 쩔쩔매던 꿈이라는 것을 꺼내고자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그 말에 저는 설움의 눈물이 차오름을 느꼈습니다. 허름해진 꿈일지라도 다시 끌어안고자 두 손 가득 들고 있었는데 그 희망의 서곡에서 그만 노래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나를 혼내도 친구에게서 모진 말을 들어도 시험에서 꼴등을 해도 목석처럼 가만히 있던 아이였습니다. 슬프긴 했지만, 늘상 반복되는 일들이라 체념했었고 아무렇지 않게 흡수시켜버리곤 감정도 이성도 백지 뒤로 덮어버린 채 지냈습니다.
그러던 제가 속상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다시 ‘꿈’을 꾸고자 생각하니 전에는 없었던 빛이 느껴졌었고, 변화하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듣자 더 잘하고 싶어 눈물이 흐른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울며 좌절했던 것이 아니었고 아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는(꿈을 추구하고 싶다는) 간절함에 눈물로 저의 감정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눈물은 흘렀지만 속으론 행복했습니다.
꿈을 찾음으로써 저는 메말랐던 감정이 살아남을 느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불행한 이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가 아니라 꿈을 꾸지 않는 자라는 것을 온 몸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끝없이 도전하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사는 삶이 분명 우리 모두를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학년 강미지 학생의 글로 ‘INDIGO+ing' 31권,p20-21,에서 투고한 글을 발췌 옮겨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