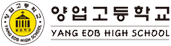학생들 표정(1)
작성자 : 윤병훈 | 조회수 : 4,090 | 작성일 : 2011년 12월 24일
학생들의 표정(1)
양업의 자치신문 ‘끌림’ 제4권지에 소개된 내용 중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90%가 잠을 잔다고 스스로 고발(?)하고 있다. 입학 면접 때, 왜 학교를 지원했느냐고 물을 때면 학생들은 “스스로 찾아 공부하는 학교가 좋아서.”라고 답했었다. 나는 그 대답이 학생들에게 솔직한 대답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애초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한다는 것이 힘든 부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성이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성숙한 어른들도 하기 힘든 부분이다. 어떤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되면 권리가 생겨나고, 권리 중 가장 적극적인 권리가 자신에게 자율성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작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율적으로 멋있게 살겠다고 작심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 작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식어버린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왔을 것이다. 자율성은 부여된 것 중에 매우 고유하고 특별한 권리로써, 이는 맡겨진 의무를 보다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추진력이 되는 것이다.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그 이상을 해내는 것도 얼마나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질 높은 자율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처음처럼’ 살도록 촉구하는 것도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어 일상을 답습하고 의무를 소홀이 하는 내 자신을 일깨우는 말이다. 습관적 타성으로 의무를 소홀이 하며 직무유기를 반복하다 보면 자신은 무기력증을 보인다. 자율성은 매력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어른에게 어려운 이것을 학생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시기상조이고 방치하면 매우 위험천만이다.
일반고와 대안학교의 차이는 학생들이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율성을 펴나가도록 보장받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 여겨진다. 그런 면에서 학생들에게 대안학교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나는 그들을 입학시켜 3년을 지켜보는데,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지내는, 그래서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는 무기력한 학생들을 본다. 이들은 어쩌면 이 학교를 찾아오지 말았어야할 학생이다. 특히 몸은 고3이나, 지적 연령은 초등학생 같은 학생들도 있다. 이런 학생을 볼 때 수업시간에 잠자는 일은 어저면 당연한일이다. 철부지 어린이란 성경의 속뜻을 지닌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였으면 좋으련만 그런 철부지도 아니다. 분별력도 결단력도 부족하고 늘 편하고 안주하는 철부지들이니 말이다.
밤새껏 이야기하다가 밤잠을 놓쳐버렸다면 수업시간에 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교실만 있으면 3년간 조는 학생들이 태반이다. 정말 솔직히 말해 선수학습을 필요한 학생들이다. 1학년 때는 수도 없이 수업시간에 졸았지만 2,3학년 때부터는 자기에게 부여된 권리 중 자율성의 권리를 의무에 충실했던 학생들이 있다. 구지 그것이 교과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춰 진로를 따른 스펙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학생들을 볼 때면 기분이 좋다. 얼마 전 엠마와 엘리사 미국 교환학생들이 양업고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다. ‘놀기 좋아한다.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 공부 안한다.’가 그 말이다. 사실 누가 놀기를 마다하고, 잠을 마다하고, 싫은 공부를 좋아하겠는가? 그들은 양업고인들이 매우 똑똑한 학생들이라고 말해주었다. 목표를 갖고 자율적으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능력이 양고인에게 있다는 말이다. 방학동안 잠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양업의 자치신문 ‘끌림’ 제4권지에 소개된 내용 중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90%가 잠을 잔다고 스스로 고발(?)하고 있다. 입학 면접 때, 왜 학교를 지원했느냐고 물을 때면 학생들은 “스스로 찾아 공부하는 학교가 좋아서.”라고 답했었다. 나는 그 대답이 학생들에게 솔직한 대답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애초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한다는 것이 힘든 부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성이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성숙한 어른들도 하기 힘든 부분이다. 어떤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되면 권리가 생겨나고, 권리 중 가장 적극적인 권리가 자신에게 자율성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작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율적으로 멋있게 살겠다고 작심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 작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식어버린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왔을 것이다. 자율성은 부여된 것 중에 매우 고유하고 특별한 권리로써, 이는 맡겨진 의무를 보다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추진력이 되는 것이다.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그 이상을 해내는 것도 얼마나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질 높은 자율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처음처럼’ 살도록 촉구하는 것도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어 일상을 답습하고 의무를 소홀이 하는 내 자신을 일깨우는 말이다. 습관적 타성으로 의무를 소홀이 하며 직무유기를 반복하다 보면 자신은 무기력증을 보인다. 자율성은 매력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어른에게 어려운 이것을 학생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시기상조이고 방치하면 매우 위험천만이다.
일반고와 대안학교의 차이는 학생들이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율성을 펴나가도록 보장받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 여겨진다. 그런 면에서 학생들에게 대안학교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나는 그들을 입학시켜 3년을 지켜보는데,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지내는, 그래서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는 무기력한 학생들을 본다. 이들은 어쩌면 이 학교를 찾아오지 말았어야할 학생이다. 특히 몸은 고3이나, 지적 연령은 초등학생 같은 학생들도 있다. 이런 학생을 볼 때 수업시간에 잠자는 일은 어저면 당연한일이다. 철부지 어린이란 성경의 속뜻을 지닌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였으면 좋으련만 그런 철부지도 아니다. 분별력도 결단력도 부족하고 늘 편하고 안주하는 철부지들이니 말이다.
밤새껏 이야기하다가 밤잠을 놓쳐버렸다면 수업시간에 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교실만 있으면 3년간 조는 학생들이 태반이다. 정말 솔직히 말해 선수학습을 필요한 학생들이다. 1학년 때는 수도 없이 수업시간에 졸았지만 2,3학년 때부터는 자기에게 부여된 권리 중 자율성의 권리를 의무에 충실했던 학생들이 있다. 구지 그것이 교과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춰 진로를 따른 스펙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학생들을 볼 때면 기분이 좋다. 얼마 전 엠마와 엘리사 미국 교환학생들이 양업고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다. ‘놀기 좋아한다.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 공부 안한다.’가 그 말이다. 사실 누가 놀기를 마다하고, 잠을 마다하고, 싫은 공부를 좋아하겠는가? 그들은 양업고인들이 매우 똑똑한 학생들이라고 말해주었다. 목표를 갖고 자율적으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능력이 양고인에게 있다는 말이다. 방학동안 잠에서 깨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