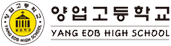소리가 말 이 되어야
작성자 : 윤병훈 | 조회수 : 3,488 | 작성일 : 2011년 7월 7일
‘소리’가 ‘말’이 되어야
파란 초원에서 짝을 이루어 평화롭게 노니는 토종닭처럼 우리 학생들도 그 놈들을 닮았다. 닭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의 간섭과 통제를 모르는 듯 자연의 생명처럼 평화롭다. 나는 늘 입버릇처럼 미성숙한 그들을 결코 통제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언제고 그들에게 원칙과 틀을 알려주며 철이 들도록 도와주며 끊임없이 기다려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그들의 미성숙한 모습을 볼 때마다 분통이 터졌다. 손과 발이 올라갔고 때로는 욕을 해댔다. 내 눈높이가 너무 높아 미성숙한 아이들의 행동을 강제하려다가 참지 못해 분통이 터진 것이다. 아직도 내 자신이 자제력도 없어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쏟아냈던 것이다. 어른들의 생각은 청소년들이 언제나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해야 되는 것이다. 만일 어른들의 말에 반기를 들어 응수라도 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자제가 안 되었다. 언제나 닭볶음탕이 먹고 싶을 때 “방목 닭 맞아요?” 하며 토종을 찾던 내가, 학생들을 내 구미에 맞게 길들여 양성하려고 끊임없이 간섭했다. 내가 교육받아오며 그런 문화에 길들여졌는데 그 습관이 어디 가랴. 나는 늘 그들에게 꼭 같은 방법으로 강요하고, 따르지 않을 때면 성화를 부렸다.
사실 나도 교육받은 훗날에서야 사회는 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만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미성숙한 철부지들은 틀과 원칙을 구속이라 여기고 마냥 자유롭고 싶어 행동하다가 제어 당하면 반항하며 기어오른다.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갖는 문제들은, 그 해법을 몰라 자기방식대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거나 방황하고 번민한다. 스스로 그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세대들이다. 다행히 자신이 노력해서 잘 풀면 다행인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 부모나 교사가 도움을 주어 해결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도움을 주고 해결해 주어야 할 어른들이 더 문제다. 어른들이 눈높이가 낮은 학생들을 끌어 올려주는 방법이 많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교사의 97%가 수업 중 문제 학생을 일부러 피한다고 답한다.(조선일보, 11. 6.24, 1면 머리기사) 그리고 지면 5에는 ‘교실이 무너진다.’며 아이들을 나무라는 내용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나는 그 원인이 어른들의 교육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생명이 어떻게 자라고 성숙하는지 생명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생의 전체를 아는 사람은 부분에 매달리지 않는다. 혹 부분이 잘못 됐을 때라도 전체를 알기에 비난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기다려 줄줄 안다. 내가 학생들을 강제하고 통제하려 했던 시절, 나에게 솔직히 교육철학이 없었다. 나도 그들이 내 말에 반항했기에, 나도 그들을 ‘문제 학생’이라 여겨 비난하고 피했었다.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생활지도 한다며 훈계하고 설교하려든다. 그러나 어른이 하는 훈계의 말을 학생들에게 ‘소리’일 뿐이다. 소리는 서로에게 대결구도이고 통하지 않는 잡음이다. 서로 통해야 하는데 잡음이기에 서로 팽팽하게 평행선을 그어갈 뿐,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서로에게 소리가 ‘말’로 변할 때가 있다. 서로에게 대화의 깊이가 있어졌기 때문이다. 소리가 ‘말’이 될 때면 서로 통했다. 어른들이 성급해서 지시, 명령하고 학생을 간섭하면 학생은 말을 소리로 알아듣는다. 그리고는 억압당하고 무시당한 느낌으로 어른들을 반사적으로 경계를 하거나 발끈한다. 어른은 자상하게 천천히 측은지심을 가지고 원칙과 틀도 가르쳐주어야 한다. 모든 운동의 원칙은 힘을 빼야 하는 것임을 나이가 들고 세상이 보이고 연륜이 쌓이니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그러고 보니 지난 내 부족한 인생도 젊음 속에 잔뜩 힘이 들어갔던 모습이 보였다.
학교 교정의 파란 풀밭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토종닭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재잘거리며 뛰어노는 학생들을 바라본다. 어느 사이 그들의 교실은 즐겁고 학교시간이 즐겁다. 집에서 빨리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학생문화는 선생님들보다 학생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문화였다. 어른들이 학생들을 기다려 주고 묵묵히 바라보며 웃음 지어주었기에 소리가 말로 바뀐 결과였다. 교육은 사육이 아닌데 어른들 자신이 여유롭지 않아 자꾸 자기방식대로 힘을 써 미성숙한 아이들을 생산성 높이려고 동물처럼 사육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본다.
파란 초원에서 짝을 이루어 평화롭게 노니는 토종닭처럼 우리 학생들도 그 놈들을 닮았다. 닭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의 간섭과 통제를 모르는 듯 자연의 생명처럼 평화롭다. 나는 늘 입버릇처럼 미성숙한 그들을 결코 통제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언제고 그들에게 원칙과 틀을 알려주며 철이 들도록 도와주며 끊임없이 기다려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그들의 미성숙한 모습을 볼 때마다 분통이 터졌다. 손과 발이 올라갔고 때로는 욕을 해댔다. 내 눈높이가 너무 높아 미성숙한 아이들의 행동을 강제하려다가 참지 못해 분통이 터진 것이다. 아직도 내 자신이 자제력도 없어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쏟아냈던 것이다. 어른들의 생각은 청소년들이 언제나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해야 되는 것이다. 만일 어른들의 말에 반기를 들어 응수라도 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자제가 안 되었다. 언제나 닭볶음탕이 먹고 싶을 때 “방목 닭 맞아요?” 하며 토종을 찾던 내가, 학생들을 내 구미에 맞게 길들여 양성하려고 끊임없이 간섭했다. 내가 교육받아오며 그런 문화에 길들여졌는데 그 습관이 어디 가랴. 나는 늘 그들에게 꼭 같은 방법으로 강요하고, 따르지 않을 때면 성화를 부렸다.
사실 나도 교육받은 훗날에서야 사회는 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만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미성숙한 철부지들은 틀과 원칙을 구속이라 여기고 마냥 자유롭고 싶어 행동하다가 제어 당하면 반항하며 기어오른다.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갖는 문제들은, 그 해법을 몰라 자기방식대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거나 방황하고 번민한다. 스스로 그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세대들이다. 다행히 자신이 노력해서 잘 풀면 다행인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 부모나 교사가 도움을 주어 해결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도움을 주고 해결해 주어야 할 어른들이 더 문제다. 어른들이 눈높이가 낮은 학생들을 끌어 올려주는 방법이 많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교사의 97%가 수업 중 문제 학생을 일부러 피한다고 답한다.(조선일보, 11. 6.24, 1면 머리기사) 그리고 지면 5에는 ‘교실이 무너진다.’며 아이들을 나무라는 내용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나는 그 원인이 어른들의 교육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생명이 어떻게 자라고 성숙하는지 생명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생의 전체를 아는 사람은 부분에 매달리지 않는다. 혹 부분이 잘못 됐을 때라도 전체를 알기에 비난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기다려 줄줄 안다. 내가 학생들을 강제하고 통제하려 했던 시절, 나에게 솔직히 교육철학이 없었다. 나도 그들이 내 말에 반항했기에, 나도 그들을 ‘문제 학생’이라 여겨 비난하고 피했었다.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생활지도 한다며 훈계하고 설교하려든다. 그러나 어른이 하는 훈계의 말을 학생들에게 ‘소리’일 뿐이다. 소리는 서로에게 대결구도이고 통하지 않는 잡음이다. 서로 통해야 하는데 잡음이기에 서로 팽팽하게 평행선을 그어갈 뿐,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서로에게 소리가 ‘말’로 변할 때가 있다. 서로에게 대화의 깊이가 있어졌기 때문이다. 소리가 ‘말’이 될 때면 서로 통했다. 어른들이 성급해서 지시, 명령하고 학생을 간섭하면 학생은 말을 소리로 알아듣는다. 그리고는 억압당하고 무시당한 느낌으로 어른들을 반사적으로 경계를 하거나 발끈한다. 어른은 자상하게 천천히 측은지심을 가지고 원칙과 틀도 가르쳐주어야 한다. 모든 운동의 원칙은 힘을 빼야 하는 것임을 나이가 들고 세상이 보이고 연륜이 쌓이니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그러고 보니 지난 내 부족한 인생도 젊음 속에 잔뜩 힘이 들어갔던 모습이 보였다.
학교 교정의 파란 풀밭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토종닭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재잘거리며 뛰어노는 학생들을 바라본다. 어느 사이 그들의 교실은 즐겁고 학교시간이 즐겁다. 집에서 빨리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학생문화는 선생님들보다 학생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문화였다. 어른들이 학생들을 기다려 주고 묵묵히 바라보며 웃음 지어주었기에 소리가 말로 바뀐 결과였다. 교육은 사육이 아닌데 어른들 자신이 여유롭지 않아 자꾸 자기방식대로 힘을 써 미성숙한 아이들을 생산성 높이려고 동물처럼 사육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