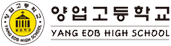지팡이와 회초리
작성자 : 윤병훈 | 조회수 : 4,099 | 작성일 : 2009년 5월 8일
지팡이와 회초리
“리더는 양떼들에게 목표를 제시해 줄 ‘지팡이’가 있어야 하며, 구성원이 부정적으로 딴전을 부릴 때면 그들이 정도(正道)를 갈 수 있도록 일침을 가하는 ‘회초리’도 있어야 한다.” (『양치기 리더십』, 케빈 리먼, 윌리엄 펜텍 저, 김영사, 2005)
군생활 시 지휘자로 있던 나의 청년시절, 최전방 소대장과 서울의 심장부, 소대장 임무를 수행했었다. 소대장이면서 사령부가 지닌 임무를 간직하고 살았고, 언제나 나는 그 목표를 소대원들에게 주지시키며 주어진 소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아주 짧은 군 생활이었지만 소대장의 지휘봉은 소대원들에게 사령부의 목표를 지향하는 지팡이였고, 구성원의 생활이 게으르고 부정적이다 싶으면 회초리를 들어 건강하게 살도록 촉구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날의 나의 리더십은 배워가는 과정에 있었다.
본당 사목자로 17년을 살면서 교구의 사목지표를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신부는 주교를 보좌해서 사목을 하기에 주교처럼 지팡이는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주교의 사목지표를 향하게 하는 지팡이가 있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하여 신자 분들이 그 목표를 지향하도록 재촉했다. 그러다 신자 분들이 방심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회초리를 들곤 했다. 그 생활 역시 리더십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때는 최선이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다.
학교가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 교육이념, 교육철학이 담긴 교훈, 교육목표, 그리고 교육과정도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학교 구성원은 오합지중처럼 우왕좌왕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을 내 손으로 뽑았지만, 구성원들을 뽑아놓고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목표가 없어 지팡이의 필요성을 갖지 못했다. 항해를 시작한 배가 목표도 없고, 방향잡이 나침반도 없이 막연히 항해를 시작한 셈이다. 세월이 제법 흘러 구성원들도 자주 바뀌었다. 함께 살던 교사가 떠나고 또 다른 구성원이 생겨날 때면 리더는 그들을 어떻게 양성 할 것인가가 더 혼란스러웠다. 세월이 지나고 리더는 목표를 가르칠 지팡이가 필요했을 때에야 비로소 구성원들과 목표를 위해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을 했다. 그 결과 리더는 목표를 가르칠 지팡이가 생겨났다. 지팡이를 간직하게 된 리더가 제 역할을 할 무렵, 교사 구성원들도 마음을 잡았고 점차 안정되어 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겨났다. 안정이라는 방심 때문에 구성원들은 안주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본질에서 멀어져 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우는 ‘좋은 학교 세미나’를 매달 두 번씩 펼쳤지만, 이상하게도 점차 우리의 주제들과 거리가 먼, 다른 주제를 놓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리더에게 지팡이는 준비되었는데 회초리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처음처럼 목표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회초리를 준비한 시기였다.
용케 정도(正道)를 찾아 걸어 온 시간을 돌아보면 큰 축복이고 은혜였다. 내가 목표를 향하는 지팡이를 가진 것도, 때론 회초리를 마련한 것도 축복이고 은혜였다. 우리가 정도를 잡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나의 리더는 하느님이셨다. 내가 공동체를 이끌며 미미한 지휘를 하고 있을 때라도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목표를 가르칠 지팡이를 마련해 주셨고 회초리도 준비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나도 하느님께 벅찬 감격으로 소리치고 싶다.
“리더는 양떼들에게 목표를 제시해 줄 ‘지팡이’가 있어야 하며, 구성원이 부정적으로 딴전을 부릴 때면 그들이 정도(正道)를 갈 수 있도록 일침을 가하는 ‘회초리’도 있어야 한다.” (『양치기 리더십』, 케빈 리먼, 윌리엄 펜텍 저, 김영사, 2005)
군생활 시 지휘자로 있던 나의 청년시절, 최전방 소대장과 서울의 심장부, 소대장 임무를 수행했었다. 소대장이면서 사령부가 지닌 임무를 간직하고 살았고, 언제나 나는 그 목표를 소대원들에게 주지시키며 주어진 소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아주 짧은 군 생활이었지만 소대장의 지휘봉은 소대원들에게 사령부의 목표를 지향하는 지팡이였고, 구성원의 생활이 게으르고 부정적이다 싶으면 회초리를 들어 건강하게 살도록 촉구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날의 나의 리더십은 배워가는 과정에 있었다.
본당 사목자로 17년을 살면서 교구의 사목지표를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신부는 주교를 보좌해서 사목을 하기에 주교처럼 지팡이는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주교의 사목지표를 향하게 하는 지팡이가 있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하여 신자 분들이 그 목표를 지향하도록 재촉했다. 그러다 신자 분들이 방심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회초리를 들곤 했다. 그 생활 역시 리더십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때는 최선이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다.
학교가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 교육이념, 교육철학이 담긴 교훈, 교육목표, 그리고 교육과정도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학교 구성원은 오합지중처럼 우왕좌왕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을 내 손으로 뽑았지만, 구성원들을 뽑아놓고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목표가 없어 지팡이의 필요성을 갖지 못했다. 항해를 시작한 배가 목표도 없고, 방향잡이 나침반도 없이 막연히 항해를 시작한 셈이다. 세월이 제법 흘러 구성원들도 자주 바뀌었다. 함께 살던 교사가 떠나고 또 다른 구성원이 생겨날 때면 리더는 그들을 어떻게 양성 할 것인가가 더 혼란스러웠다. 세월이 지나고 리더는 목표를 가르칠 지팡이가 필요했을 때에야 비로소 구성원들과 목표를 위해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을 했다. 그 결과 리더는 목표를 가르칠 지팡이가 생겨났다. 지팡이를 간직하게 된 리더가 제 역할을 할 무렵, 교사 구성원들도 마음을 잡았고 점차 안정되어 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겨났다. 안정이라는 방심 때문에 구성원들은 안주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본질에서 멀어져 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우는 ‘좋은 학교 세미나’를 매달 두 번씩 펼쳤지만, 이상하게도 점차 우리의 주제들과 거리가 먼, 다른 주제를 놓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리더에게 지팡이는 준비되었는데 회초리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처음처럼 목표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회초리를 준비한 시기였다.
용케 정도(正道)를 찾아 걸어 온 시간을 돌아보면 큰 축복이고 은혜였다. 내가 목표를 향하는 지팡이를 가진 것도, 때론 회초리를 마련한 것도 축복이고 은혜였다. 우리가 정도를 잡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나의 리더는 하느님이셨다. 내가 공동체를 이끌며 미미한 지휘를 하고 있을 때라도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목표를 가르칠 지팡이를 마련해 주셨고 회초리도 준비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나도 하느님께 벅찬 감격으로 소리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