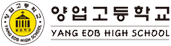7천만원의 10년 이자
작성자 : 윤병훈 | 조회수 : 4,744 | 작성일 : 2008년 11월 26일
7천만 원의 10년 이자
1998년, 양업이 개교 할 때의 일이다. 학교설립의 주체가 교구지만 파견 받은 나로서는 땡전 한 푼도 없는 가난뱅이였다. 그런 내가 학교를 세운다니 모두가 웃었다. 차라리 나에게 아무 것도 없던 것이 오히려 맨 땅에 헤딩할 용기가 났나보다. 세상에 웃음거리였지만 뱃장 좋게 나는 굴삭기로 땅을 파고 건물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하느님의 배경이 든든한 힘이 된 셈이다. 용기 내어 구걸하며 돌아다닌 덕에 어느 덧 학교가 서있고 학생들을 위한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동안 많은 은인 분들을 만났고 우리가 성장해 갔다. 크고 작은 도움들도 세월 속에 빛바랜 낙엽처럼 격세지감이 든다. 슬픈 일이 되지 않도록 겨우 10주년 미사를 드릴 때면 어제의 일들을 기억해보며 감사하며 기도한다.
2008년 11월 마지막 주간에 한 장의 메모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메모지에는, ‘010-0000-0000, 김○○ 수녀님(교도사목), ‘전화 부탁하셨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엊그제 동창 신부 은경축에도 잠깐 만났던 수녀님은 그 날도 예전처럼 구김 없이 호탕하게 웃고 계셨다. 교도소 수감자들의 대모인, ‘겨울빨래’-아무도 못 말린다는 의미로 붙여진 별명임-수녀님이 전화를 달라고 하셨는데 ‘웬일일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며 전화를 걸었다. 예전처럼 수녀님은 “응, 나여”하며 껄껄 웃으시고는, “나, 돈 5백이 필요하거든, 출소자가 컴퓨터실을 개업하는데, 자활센터에 컴퓨터 10대가 필요하데, 나도 걔들에게 조금 전에 5백 줬어.” 그 말씀에 아차 빚진 죄인에게 빚 독촉하신다고 생각하고는, “네, 수녀님, 계좌번호 알려 주세요.” 라는 한마디를 하고는 대화를 끝냈다.
학교를 세우면서 나는 그 수녀님에게 큰 빚을 진 죄인이었다. 10년 전, 내가 맨 땅에 헤딩하고 있을 시절, 당시 교도소 사목을 하고 계신 수녀님이 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을 했다며 나에게 두루마리 신문 뭉치를 건네며, “이거 아직은 내게 필요 없어! 양업에 돈이 필요할 텐데 받아” 하시면서 받아안은 꾸러미를 풀어보니 돈이 자그마치 7천만 원이었다. IMF로 곤궁기였는데 거금을 보고는 깜짝 놀랐었다. 하느님이 주신 큰 선물이었다.
10년을 지나면서 수녀님은 나에게 “지금 출소하는 놈이 한 놈 있으니 받아 줘”하며 떼를 쓰곤 했었다. 그 소원을 그 수녀님께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것도 죄인이었다. 그 후에도 수녀님은 수녀원 옆에 출소자들을 위한 자활센터를 아담하고 예쁘게 지어주었었다. 그 분을 볼 때마다 나는 겨울빨래를 생각하며 아무도 못 말리는 훌륭하신 수녀님을 존경했다. 수녀님은 수인들의 대모로서 출소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계시다. 아마도 수녀님은 내가 은경 축을 지나고 있는 신부라는 것도 아셨고 과감하게 부탁해도 들어줄 것이라 여기셨을 것이다. “돈 5백을 빨리 보내요.” 라며 명령조로 거침없이 부탁하시는 수녀님이 오늘 따라 더 시원스럽고 좋다.
수녀님이 내게 주신 원금은 어제의 학생들에게 다 써버려 상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탁은 거절할 수가 없다. 수인의 대모, 출소자들의 대모님이 하느님의 사랑을 모아 훈훈한 삶을 꾸려주시나 보다. 얼마 전에 만난 수녀님은 7순을 넘겼지만 여전히 청춘을 사시는 것 같다.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로 산다는 것이 이 수녀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까.
1998년, 양업이 개교 할 때의 일이다. 학교설립의 주체가 교구지만 파견 받은 나로서는 땡전 한 푼도 없는 가난뱅이였다. 그런 내가 학교를 세운다니 모두가 웃었다. 차라리 나에게 아무 것도 없던 것이 오히려 맨 땅에 헤딩할 용기가 났나보다. 세상에 웃음거리였지만 뱃장 좋게 나는 굴삭기로 땅을 파고 건물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하느님의 배경이 든든한 힘이 된 셈이다. 용기 내어 구걸하며 돌아다닌 덕에 어느 덧 학교가 서있고 학생들을 위한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동안 많은 은인 분들을 만났고 우리가 성장해 갔다. 크고 작은 도움들도 세월 속에 빛바랜 낙엽처럼 격세지감이 든다. 슬픈 일이 되지 않도록 겨우 10주년 미사를 드릴 때면 어제의 일들을 기억해보며 감사하며 기도한다.
2008년 11월 마지막 주간에 한 장의 메모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메모지에는, ‘010-0000-0000, 김○○ 수녀님(교도사목), ‘전화 부탁하셨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엊그제 동창 신부 은경축에도 잠깐 만났던 수녀님은 그 날도 예전처럼 구김 없이 호탕하게 웃고 계셨다. 교도소 수감자들의 대모인, ‘겨울빨래’-아무도 못 말린다는 의미로 붙여진 별명임-수녀님이 전화를 달라고 하셨는데 ‘웬일일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며 전화를 걸었다. 예전처럼 수녀님은 “응, 나여”하며 껄껄 웃으시고는, “나, 돈 5백이 필요하거든, 출소자가 컴퓨터실을 개업하는데, 자활센터에 컴퓨터 10대가 필요하데, 나도 걔들에게 조금 전에 5백 줬어.” 그 말씀에 아차 빚진 죄인에게 빚 독촉하신다고 생각하고는, “네, 수녀님, 계좌번호 알려 주세요.” 라는 한마디를 하고는 대화를 끝냈다.
학교를 세우면서 나는 그 수녀님에게 큰 빚을 진 죄인이었다. 10년 전, 내가 맨 땅에 헤딩하고 있을 시절, 당시 교도소 사목을 하고 계신 수녀님이 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을 했다며 나에게 두루마리 신문 뭉치를 건네며, “이거 아직은 내게 필요 없어! 양업에 돈이 필요할 텐데 받아” 하시면서 받아안은 꾸러미를 풀어보니 돈이 자그마치 7천만 원이었다. IMF로 곤궁기였는데 거금을 보고는 깜짝 놀랐었다. 하느님이 주신 큰 선물이었다.
10년을 지나면서 수녀님은 나에게 “지금 출소하는 놈이 한 놈 있으니 받아 줘”하며 떼를 쓰곤 했었다. 그 소원을 그 수녀님께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것도 죄인이었다. 그 후에도 수녀님은 수녀원 옆에 출소자들을 위한 자활센터를 아담하고 예쁘게 지어주었었다. 그 분을 볼 때마다 나는 겨울빨래를 생각하며 아무도 못 말리는 훌륭하신 수녀님을 존경했다. 수녀님은 수인들의 대모로서 출소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계시다. 아마도 수녀님은 내가 은경 축을 지나고 있는 신부라는 것도 아셨고 과감하게 부탁해도 들어줄 것이라 여기셨을 것이다. “돈 5백을 빨리 보내요.” 라며 명령조로 거침없이 부탁하시는 수녀님이 오늘 따라 더 시원스럽고 좋다.
수녀님이 내게 주신 원금은 어제의 학생들에게 다 써버려 상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탁은 거절할 수가 없다. 수인의 대모, 출소자들의 대모님이 하느님의 사랑을 모아 훈훈한 삶을 꾸려주시나 보다. 얼마 전에 만난 수녀님은 7순을 넘겼지만 여전히 청춘을 사시는 것 같다.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로 산다는 것이 이 수녀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