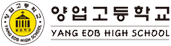연길에서의 학생들 이야기
작성자 : 후원회 | 조회수 : 2,952 | 작성일 : 2006년 10월 11일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FONT face=돋움체><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FONT face=돋움체>조선자치구 연길에서 훈춘 사이에 길게 늘어진 마을마다 중국어과 한국어를 병기한 간판들이 즐비하다. 그 곳의 사람들은 일상 언어도 중국말이나 우리말이다. 마치 우리 고향에 와 있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곳은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과 경제적 이유로 만주로 이주해 와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후손들이 머물고</FONT> <FONT face=돋움체>있는 곳이다. 이렇게 살기 시작한 선조들이 2차대전의 종전과, 해방 후 6·25를 거쳐 남북분단으로 조국 대한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벌써 5대째란다. 얼마나 애환이 많았을까?</FONT></SPAN> </FONT></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FONT face=돋움체><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FONT face=돋움체>지금 그들은 또 다른 경제적 상승을 위해 연길을 버리고 어디론지 떠나가고 있다. 그곳도 우리처럼 기러기 아빠, 엄마들이 수없이 많다고 들었다. 조선족들은 한국 방송을 자유롭게 시청하고 있었고, 그 여파로 조선족의 의식과 문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를 맞고 있었다. 연변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해외로 떠나간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유아시절부터 홀로 버려진 상황에서 고등학생이 된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였다. 가정교육의 부재로 중도탈락 학생들이 늘어나고 윤리성이 희박해서 교육현장이 혼란스럽다고 하였다. 부모가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요원한 일처럼 되었다고 했다. 하나 밖에 없는 자녀교육 때문에 이산가족이 생겨나는 것은 역시 이 곳 중국 연변도 예외는 아니었다. 너른 대지에 사는 조선족은 풍부하게 먹고, 행복지수가 드높지만 수중에 돈이 없어 목돈 마련을 위해 이산가족이 된다는 것이었다. 연변은 경제발전만큼 가정의 붕괴도 심각하다고 했다. 연길은 소비의 도시일 뿐 더 이상 생산력도 없고 젊은 층이 없는 빈 都市라고 했다. 거리마다 빼곡히 들어선 노래방 간판이 연길을 지키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소비와 탈선으로 내 몰고 있다고 걱정을 하였다. 결국 발전의 속도 격동기를 맞지만 희망의 빛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연길에서 우리 학생들이 경험한 이야기 한 토막을 적어 본다</FONT>.</SPAN> </FONT></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FONT face=돋움체> 학생들이 용정에 위치한 ‘일송정’을 견학 후, ‘대성학교’에서 ‘용두레 우물’까지는 인력거를 타고 이동했다. 요금은 1위엔 이었다 한국 돈 130원이다. 감자농장에 아주머니 하루 품삯이 3위엔 이다. 동재가 먹고 싶어 사온 초콜릿은 5위엔이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번 품삯을 아무 생각 없이 단번에 먹는 것으로 소비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동재는 무엇인가 깨달았는지 친구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우리 학생들이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르게 싼 가격에 자주 슈퍼를 들락거리며 먹는 것으로 돈을 낭비하고 있음을 알아챘던 것이었다. 우리가 머물렀던 훈춘의 한 호텔 보이가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부러운 듯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눈을 돌렸다. 친근하게 눈인사를 하자 말문을 열면서 우리 학생들과 동갑이라고 했다. 호텔에서 작별하던 날, 그가 말했다. “제 수중에는 1위엔도 없어요. 사먹고 싶지만 생각뿐입니다. 저렇게 마음대로 사먹고 싶은데···” 라며, 말끝을 흐리면서, 돈이 없어 고등학교 진학을 접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누군가가 100위엔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용기내서 잘 살아요” 라는 말로 작별인사를 했다. 그와 헤어지며 우리 학생들도 격려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지배인이 나와 “잘 가요. 내년에 다시 만나요. 한국이 더욱 잘 살기를 바랍니다. 건달정치가 끝나야 할 텐데···”하며 걱정 섞인 여운을 남기며 떠나는 학생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어 고마움에 답례하고 있었다. </FONT></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FONT face=돋움체><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FONT face=돋움체>조선자치구 연길에서 훈춘 사이에 길게 늘어진 마을마다 중국어과 한국어를 병기한 간판들이 즐비하다. 그 곳의 사람들은 일상 언어도 중국말이나 우리말이다. 마치 우리 고향에 와 있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곳은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과 경제적 이유로 만주로 이주해 와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후손들이 머물고</FONT> <FONT face=돋움체>있는 곳이다. 이렇게 살기 시작한 선조들이 2차대전의 종전과, 해방 후 6·25를 거쳐 남북분단으로 조국 대한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벌써 5대째란다. 얼마나 애환이 많았을까?</FONT></SPAN> </FONT></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FONT face=돋움체><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FONT face=돋움체>지금 그들은 또 다른 경제적 상승을 위해 연길을 버리고 어디론지 떠나가고 있다. 그곳도 우리처럼 기러기 아빠, 엄마들이 수없이 많다고 들었다. 조선족들은 한국 방송을 자유롭게 시청하고 있었고, 그 여파로 조선족의 의식과 문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를 맞고 있었다. 연변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해외로 떠나간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유아시절부터 홀로 버려진 상황에서 고등학생이 된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였다. 가정교육의 부재로 중도탈락 학생들이 늘어나고 윤리성이 희박해서 교육현장이 혼란스럽다고 하였다. 부모가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요원한 일처럼 되었다고 했다. 하나 밖에 없는 자녀교육 때문에 이산가족이 생겨나는 것은 역시 이 곳 중국 연변도 예외는 아니었다. 너른 대지에 사는 조선족은 풍부하게 먹고, 행복지수가 드높지만 수중에 돈이 없어 목돈 마련을 위해 이산가족이 된다는 것이었다. 연변은 경제발전만큼 가정의 붕괴도 심각하다고 했다. 연길은 소비의 도시일 뿐 더 이상 생산력도 없고 젊은 층이 없는 빈 都市라고 했다. 거리마다 빼곡히 들어선 노래방 간판이 연길을 지키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소비와 탈선으로 내 몰고 있다고 걱정을 하였다. 결국 발전의 속도 격동기를 맞지만 희망의 빛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연길에서 우리 학생들이 경험한 이야기 한 토막을 적어 본다</FONT>.</SPAN> </FONT></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FONT face=돋움체> 학생들이 용정에 위치한 ‘일송정’을 견학 후, ‘대성학교’에서 ‘용두레 우물’까지는 인력거를 타고 이동했다. 요금은 1위엔 이었다 한국 돈 130원이다. 감자농장에 아주머니 하루 품삯이 3위엔 이다. 동재가 먹고 싶어 사온 초콜릿은 5위엔이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번 품삯을 아무 생각 없이 단번에 먹는 것으로 소비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동재는 무엇인가 깨달았는지 친구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우리 학생들이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르게 싼 가격에 자주 슈퍼를 들락거리며 먹는 것으로 돈을 낭비하고 있음을 알아챘던 것이었다. 우리가 머물렀던 훈춘의 한 호텔 보이가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부러운 듯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눈을 돌렸다. 친근하게 눈인사를 하자 말문을 열면서 우리 학생들과 동갑이라고 했다. 호텔에서 작별하던 날, 그가 말했다. “제 수중에는 1위엔도 없어요. 사먹고 싶지만 생각뿐입니다. 저렇게 마음대로 사먹고 싶은데···” 라며, 말끝을 흐리면서, 돈이 없어 고등학교 진학을 접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누군가가 100위엔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용기내서 잘 살아요” 라는 말로 작별인사를 했다. 그와 헤어지며 우리 학생들도 격려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지배인이 나와 “잘 가요. 내년에 다시 만나요. 한국이 더욱 잘 살기를 바랍니다. 건달정치가 끝나야 할 텐데···”하며 걱정 섞인 여운을 남기며 떠나는 학생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어 고마움에 답례하고 있었다. </FONT></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